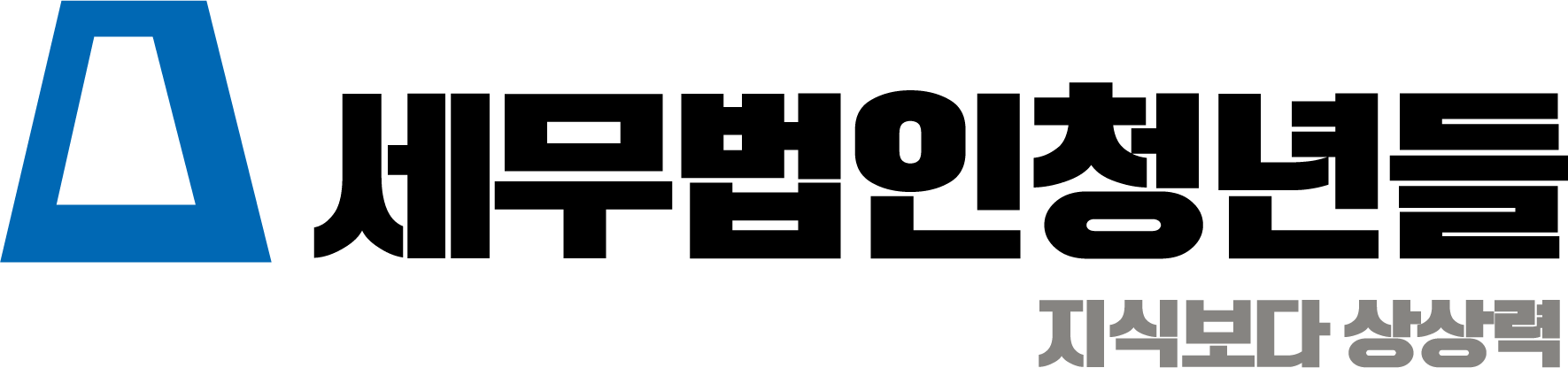관성의 층위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설정된다.
정신적 성장이 기폭제가 되어 이상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소년이 어른이 되는 순간을 육체의 성장으로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조각가 이상현은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60점짜리 아비의 밑에서는 60점 짜리 자식이 나온다.” “30점 짜리 아비의 밑으로는 30점 짜리 자식이 나온다.”
그의 역사인식에 동감한다. 그는 몰락한 전주이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을 다큐로 만들었다.
다큐의 내레이션 중 이런 구절이 나온다. “한 하늘 아래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 일본.”
한일합방과정에서 대한제국황실의 해체과정을 묘사한 그의 다큐에는 다분한 감정이 묻어있다.
황실과 거리가 먼 나는 작가의 태도와 다큐를 한발자국 뒤에서 볼 수 있었다.
동학농민운동이 파리시민혁명에 버금가는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러 마땅하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하지만 동학이 결코 혁명이 아닌 운동에 그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동학의 정신을 높게 평가하는 일은 근대적 관점으로 보아 타당한 일이나 시대를 전복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와 하나의 현상으로 남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패배했다면 왜 패배했는지 아는일이 가장 중요하다.
패배한 역사를 아비삼아 다시금 패배를 반복할 수 없는 일인 탓이다. 후손들에겐 멋진 할아버지로 남고싶다.
나는 공교롭게 지역의 공예와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금강의 도자기와 임진왜란에서 한일합방까지 이어지는 17세기~19세기의 국제 정세가 오늘의 나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패배의 넋두리 대신 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는지. 승자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인지.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패배와 승리라는 관념보다 중요한것은 ‘나’로서 사는 일임을 깨달았다.
(계속)
임진왜란은 일본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다.
센고쿠시대의 말미에 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바로 섬나라 일본의 땅은 한정되어있고, 이로인해 장수들에게 나누어줄 땅이 전부 소진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도요토미는 스스로를 하늘이 내린 사람인 천하인이라 칭하고 대륙으로 눈을돌려 전쟁을 일으킨다. 임진왜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또한 열도인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잃어버린 고향이었다. 그 옛날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할 당시 백제군의 계백의 직책은 달솔이다. 또한 백제를 구하기위해 파병된 왜의 총책임자의 직책도 달솔이었다. 왜는 백제의 위성국가 였던것이다. 신라와 고구려의 영향또한 지대했다. 히데요시의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다가의 가장 강력했던 맞수였던 다케다 신겐은 신라삼랑이라는 깃발을 들고 전쟁에 임했다. 신라의 세번 째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일본의 지배계층은 대부분 한반도에서 넘어온 도래인들로 구성되어있다. 히데요시의 정치적 목적과 잃어버린 고향을 찾고자하는 열도인의 열망이 17세기 동아시아의 세계대전인 임진왜란을 발발 시켰고 그 나비효과는 오늘의 세계를 구성한다.
고니시를 선봉으로 파죽지세로 진격해오는 일본군.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을 떠난다. 분노한 조선의 백성들은 궁전을 불질러버린다.